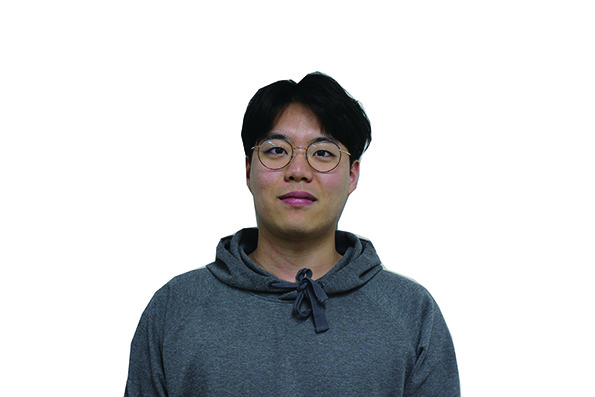
작년 여름에 시작했던 동대신문 기자로서의 활동이 벌써 한 학기를 뒤로하고 새 학기를 앞두고 있다. 기껏해야 6개월 활동했을 뿐인데 이 글을 적으며 감상에 젖는 내 모습이 겸연쩍어서 웃음이 난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분명히 새롭고 유익한 경험을 학보사를 통해 얻었다. 처음으로 기사라는 걸 써 보았고, 다른 사람을 인터뷰해 보았으며, 내가 읽은 책을 불특정 다수가 보는 지면에 소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잊을 수 없는 일은 두 발로 뛰어서 조현병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은 일이고, 학교 노동 구성원분들과 대화 나눈 일이다. 아마 학보사 기자가 아니었다면 그분들의 소리를 이렇게 생생히 듣는 기회는 없었을 것이다.
방학 동안 즐겁게 보던 <검사내전>이라는 드라마가 있다. 검사라는 직업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점이 인상적인 작품이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직업과 직무 사이의 괴리에 대해서 생각해볼 기회가 있었다. 정의를 실현하는 만큼 고등한 윤리적, 실무적 조건을 필요로 하는 검찰이라는 직무는 사람이 맡는 일이기에 결코 완벽히 실현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검찰이라는 조직 역시 사람의 집단이기 때문에 무결하지 않다. 기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기자의 직무는 여러 방면의 소식과 정보, 이야기들을 듣고 퍼뜨리는 일이지만 사람이 맡아서 하는 일이기에 끊임없이 제한이 발생한다. 그건 시스템의 한계일 수도 있고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다. 학생이면서 취업을 생각할 시기라는 핑계로 기사 쓰는 동안 온전히 그 일에 집중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또 진심으로 대해야 하는 어떤 기사 작업을 부담스러운 업무로 취급한 적도 없지 않다.
학보사 기자 활동을 하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동대신문, 더 넓게는 동국대학교라는 조직 혹은 체계에 대해서 생각한다. 결코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아프지만 그게 사실이다. 그래서 어쩔 땐 한없이 무력해지며 모든 게 회의적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그래, 어쩌면 그게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 일에 책임을 느끼고 직무의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사람의 의지와 방향성 안에 문제해결이 잠재돼있다, 고 낙관해 보기로 한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은 다르게 변용되어도 좋을 것 같다. 길지만 이렇게 말이다. “어떤 자리든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그래도 자리는, 사람이 움직일 방향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