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훈, 『SF는 공상하지 않는다』, 은행나무,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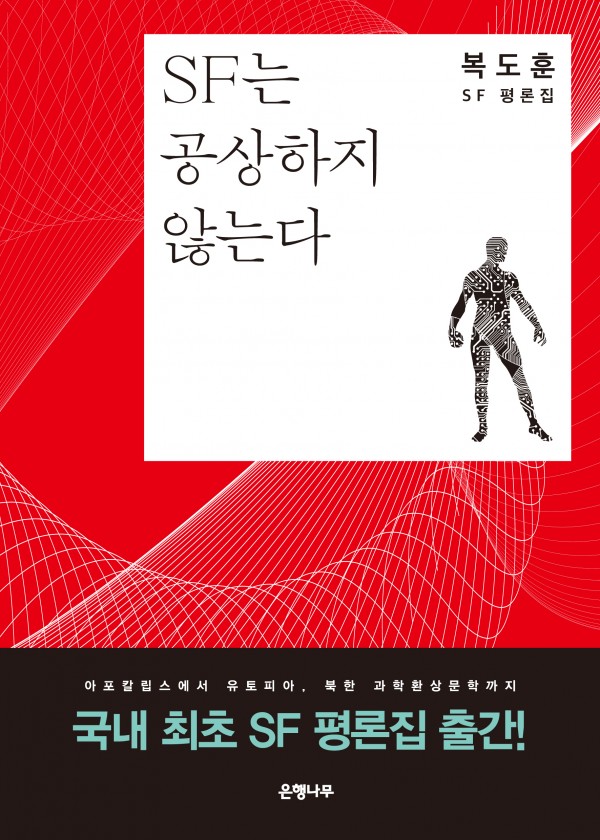 |
1990년대 이후 한국문학 특히 소설의 양상은 이전시대와는 많이 달라졌다. 작가와 독자 양자가 기대고 했던 문화적 토대자체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87년 민주화와 뒤이은 공산진영의 해체는 1980년대까지 공고하던 ‘운동(movement)으로서의 한국문학’을 근본부터 뒤흔들었다. 그 와중에 새로운 세대는 디지털 신(新) 테크놀로지와 고도성장의 열매인 각종 소비문화적 소양을 전면에 내세운 ‘신세대문학’을 선보였다. 기존의 문학인들에겐 아찔하게 보였을 상황이었겠지만 이러한 경향은 ‘현대문학’ 발전과정의 필연적인 결과였다. 프레드릭 제임슨은 어떤 책에서 현대적 문학생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문학은 궁극적으로 적정한 커뮤니케이션을 보증해주는 지침과 억양, 몸짓, 문맥상의 지시성과 화용성(pragmatics) 같은 공통의 약속에 입각한, 의미를 자유롭게 기술(describe)하는 이데올로기의 특정한 방식이다. 현대사회(산업화된 자본주의사회)의 문학생산은 문학의 적정성을 규정하던 기존의 담론을 해체-위반하면서 이를 보다 복잡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상황으로 재구성하는 양식이다. 특정 문학 혹은 문화를 가시화하는 문학적 상연은 그것을 적정한 문학체계로 이해하게 하는 사회적인 약속을 언제나 초과하는 ‘기호’를 매개로 한다. 글쓰기 예술로서 문학에 내재한, 의미체계와 묘사의 간극은 사회가 다변화되고 발화자의 위치와 매체상황이 복잡해짐에 따라 일정한 장르상의 적정한 규칙과의 가족유사성 체계로 점차 은유화되어 글쓰기에 녹아들어가게 된다. ‘운동’이라는 적정성의 원리에서 해방된 문학은 각종문화 그리고 매체와의 이합집산 속에서 이전에는 ‘본격문학’의 하위항목 정도로 치부되던 각종 장르문학의 관습과 규범과도 가족 유사적 관계를 맺게 됐다. 1990년대 이후 문학이 여타장르와 각종문화와 맺은 표현의 가능성과 역량은 문학을 이해하는 상수가 된지 오래다.
비평가 복도훈의 최근작 『SF는 공상하지 않는다』는 이 새삼스러운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 최초의 SF 비평집을 자처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그렇다. 어쩌면 지금까지 한국어 화자에 의해 쓰인 SF 장르 일반론 중 최량의 것일지도 모를 초반부 「SF, 과학(science)와 픽션(fiction) 사이에서」까지 읽었을 때 이런 심증은 점차 확증으로 변해간다. 도합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 앞의 세 개의 장은 문학생산 일반의 가족유사성 체계의 한 축으로 녹아들어간 SF장르의 체계가 이천년대 이후 한국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조우하는 양상을 과감한 독해로 선보인다.
다만 2부의 말미 북한 과학소설을 다룬 글 두 편은 개인적으로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았다. 남한을 포함한 서구 SF 체계의 규범인 ‘당대과학의 인지적 패러다임을 중요한 서술적 구성요소로 하는 즐거움 혹은 명상의 문학 장르’라는, 이번 평론집의 대전제만으로는 온전히 설명될 수 없는 측면이 많다. 북한의 과학소설 생산양식을 논하기 위해서는 전후 소비에트에서 출현한 진보이념의 낭만주의 미학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자본주의 체제의 SF 생산양식과 소비에트 체제의 그것은 당대과학의 인지적 패러다임이라는 대전제를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선상에서 논하기엔 아직 해명돼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된다.
마지막 장인 4부는 앞장과의 연속성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해나가다 마지막에 가선 결국 SF를 초과하고 만다. ‘SF 평론집’이라는 책의 취지를 배반하는 듯도 한 이 마지막 챕터에서 복도훈은 “재난, 파국, 종말, 묵시와 같은 가족유사성을 지닌 어휘들”(412쪽)을 SF장르와 가족유사적 관계에 위치시킨다. 그렇게 이 책은 특정장르를 대상으로 한 비평모음집을 넘어 비평가 복도훈이 오랜 기간 천착해온, 마르크시즘에 입각한 유물론적 문학비평의 최신판으로 완전히 일신하면서 마무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