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ygmund Baumann, Consuming Life, Polity Press,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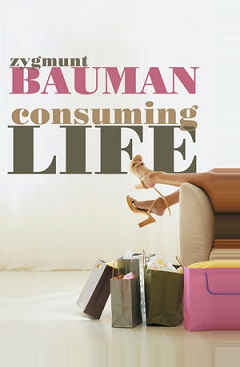 | ||
지난 여름, 연극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화두는 ‘감시’일 것이다. 연극창작 국가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진행주체인 문화예술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정치 풍자적 내용의 연극을 공연했던 단체의 연출가에게 사업지원 철회를 요구했다는 사건과, 세월호 사건을 연상시키는 내용의 공연을 국가기관 소속인이 방해했던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일련의 사건들이 갖는 시대착오적 속성을 잠시 차치해두고서, 그것들을 ‘국가에 의해 억압된 예술적 표현의 자유’라는 너무나 익숙한 수사로 일괄해 버린다면, 그것은 너무나 간단한 독해에 머무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시대의 감시에 대한 질문과 탐구, 이 시대착오적 현상이 발생한 이유를 규명하는 일일 것이다.
사실 오늘날 감시는 더 이상 일원적 판옵티콘의 산물이 아니다. 신옵티콘(syn-opticon)이나 반옵티콘(ban-opticon)이라는 조어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은 빅브라더의 전유물에서 탈피하여 일상의 영역에서 작동한다. 예컨대 CCTV에서부터 병원의 진료기록 시스템, SNS상의 노출과 그 관람 등,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일상적인 것들은 감시를 현실적 조건으로서 수용한 문화적 산물이다. 이렇게 일상화된 감시를 떠받치는 동력으로서 의문이 제기되어야 할 지점은,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감시에 적극적으로 편승하겠다는 마음, 기꺼이 착오적인 그것을 선택하겠다는 자유의 정당성이며, 사유가 진전되어야 할 바는 지그문트 바우만이 ‘주체성에 대한 도착적 숭배(subjectivity fetishism)’라고 부른 맥락에 있다.
본서에서 저자는 모든 이가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라는 소비사회적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그들이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삶을 개진하는 듯 보이지만, 그 선택들은 자유 그 자체라기보다는 자유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에 불과함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주체성은 선택의 양에 비례하는 듯 여겨지며, 도착적으로 물신(fetish)화된다. 그리고 양적으로 환원된 삶은 내용에 무관심(adiaphorization)하다.
그러므로 오늘의 자유는 위험하다. 이 때 주체로서 호명되는 개인은 진정 정치적인 주체로 현현하지 못한 채 자유-이미지의 자발적 노예로 전락해 있고 그의 선택은 이미 자유와 배치된다. 현재 우리의 정치가 문제라면, 대두되는 빅브라더는 그것의 외면일 뿐이다. 그것은 이를테면 오류이다. 보다 본질적인 것은 정치의 부재가 아닌가. 만약 주체의 위치를 시선의 겹침 속에, ‘봄’과 ‘보여짐’ 사이에 설정하고, 그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면 어떠한가? 그렇다면 어떻게 어떤 주체로서 이 시선들의 집합에 참여할 것이며 그를 통해 어떤 관계를 구축해낼 것인가가 핵심이 될 것이다.
단순히 스스로를 무한한 자유의 주체로 여기는 소비 시스템의 원자들은 타자에 대한 구경꾼이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타자를 포르노적으로 응시할 뿐, 어떠한 정치를 제시하지 못한다. 오히려 민주주의적 정치가 가능한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무근저의 무한 자유 주체로 여기는 무저갱 속에서가 아니라 타자에 온전히 맞서 자신의 자유를 타당하게 옹호하고 주장하여 쟁취할 수 있는 토대 위에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