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생활정보지 <바람의 연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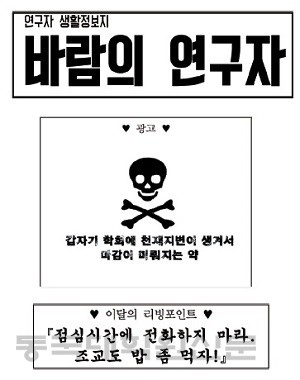 | ||
| △ <바람의 연구자>에는 이달의 리빙포인트’와 광고 등 연구자의 생활 제반에 유익하고 재치 있는 정보들이 게재된다. | ||
“좋은 연구자가 되지 못하면 너는 괴물이 되고 만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 잔혹한 동화 속에 들어선 대학원생이라면 ‘좋은 연구자’란 무엇일까, ‘나’는 과연 괴물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곰곰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보면 “어쩐지 나는 연구자답지 못하다거나, 역시 나는 연구자가 될 만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자괴감와 열패감에 시달리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건 퍽 “외로운 길”임에 분명할 것이다. <바람의 연구자>는 그 “외로운 길” 위에 선 연구자들이 “우리가 서 있는 여기는 어디일까”를 물으며 서로의 ‘있음’을 확인해주는 ‘다정한’ ‘생활정보지’이다.
<바람의 연구자>는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공부하는 3명의 편집위원이 각각 ‘딴짓쟁이Go’, ‘화살맞은 아킬레우스’, ‘불꽃남자 정대만’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2013년 8월 창간준비호를 발행한 이후 어느덧 22호를 냈다. 이미 인문학 연구자들 사이에는 입소문이 자자한 인기 매거진이지만 발행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몇몇 연구소와 인문학 단체를 비롯하여 개별 구독 신청을 한 연구자들에게 직접 배송을 하는 유통 형태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행 비용은 편집위원 각자가 부담하지만, 종이매거진의 형태와 무료배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 호는 A4 사이즈 4면 분량으로 제작되는데, 3명의 편집위원들이 원고 작성과 기획, 편집, 교정·교열과 인쇄, 발송에 이르는 전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바람의 연구자>라는 제호에서 알 수 있듯이 <바람의 연구자>는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자라는 이름을 잊은 채로 안착하거나 되먹히는 와중에서 자신이 연구자임을 끊임없이 되묻고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 어딘가에서 훌쩍훌쩍하고 있을 바람의 연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매거진이다. ‘연구자 생활정보지’를 표방하는 <바람의 연구자>는 “밤샘을 하고, 아침을 거르고, 세미나 발제를 하고, 과외 알바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술을 마시고 울고불고 하는 연구자의 생활” 속에서 아롱지는 기쁨과 슬픔, 뿌듯함과 외로움 같은 감정들을 공유하자고 외친다. 그러나 막막하고 고달픈 삶의 비애와 절망들을 엄숙하고 서글프게 담아낸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바람의 연구자>는 말한다. “자조나 자학은 <바람의 연구자> 말고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는 다정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매호 특집 주제들로 기획되는 <바람의 연구자>는 ‘연구자와 조교’, ‘연구자의 연애’, ‘연구자의 연구공간’, ‘연구자의 건강’, ‘연구자의 쇼핑’ 등 연구자라면 서로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로 꾸려진다. 연구자로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주제들을 다루는 필치에는 연구자식 재치와 유머가 진하게 배어 있다. ‘쉬워보여 지젝’, ‘헤르만 허세’, ‘DKNY(독거노인)’ 등 연구자의 생활과 경험이 어우러진 익살맞은 작명, “<바람의 연구자> 그 자체는 이를테면 의사소통의 수공업적 형태다(발터 벤야민)”라는 패러디 추천사, 야구 경기를 위한 캐치볼 연습이 좋으냐는 후배의 질문에 “야, 너는 논문 쓸 때, 네가 재미있어하는 주제라도, 선행연구 검토까지 재밌냐?”라고 답변하는 선배의 비유처럼 말이다.
‘불꽃남자 정대만’은 창간준비호에서 “연구자는 어떤 ‘특별한’ 것도 아니었고, ‘괴물’도 아니었”으며 그것은 “단지 삶을 살아내는 것의 문제인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살아내는 것의 문제’를 <바람의 연구자>는 담담히 담아내고 있다. 자신은 바보 얼간이 똥덩어리이므로 공부를 할 수 없다고 울부짖으며 애인애게 패악을 떨거나,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들로부터 “너는 네가 하고 싶은 일만 하니까 좋겠다”라는 말을 듣거나, 자신이 ‘공부’를 한답시고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늙고 병든 부모님이 스스로 감당해야 했던 일들을 곱씹는 일이 뭐가 더 새롭겠는가. 그러한 삶 속에서 “돈은 없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논문 쓰기는 정말 힘들고, 학부 동기들은 진즉에 잘 나가는 사회의 일꾼이 되었고” 그런 와중에도 “자의식으로 가득 찬 대학원생들의 넋두리, 딱히 해결할 방도도 없는 자기비하와 자괴로 점철된 넋두리는 정말 지겹다, 대책 없는 자기 위안의 정신 승리를 둥둥대는 건 더 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혹은 그런 말을 보듬어 들어주는 것이 <바람의 연구자>가 전하는 ‘생활정보’이고 ‘다정함’일 것이다. “어딘가에서 훌쩍훌쩍하고 있을 바람의 연구자들을 위해” 씌어졌다는 이 편지는 언젠가의 내가 나를 위해 미리 써놓은 그 편지일지도 모른다.
“우린 어쩌다가 이 작은 지면에서 만나게 된 걸까요. … 당신도 나도 시작은 흠모와 열정이었을 테지요. 무지했기에 무모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꾸만 조심스러워지고 자신이 없어집니다. 몸은 쉬이 피로해지고 정신은 그보다 인내심이 없습니다. … 어느새 자조와 비관에 익숙해졌고 몰려드는 시시한 일에 재빨리 타협해버리곤 합니다. 이렇게 빨리 지쳐도 괜찮은 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