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현재를 이어주는 숨쉬는 역사, 조선왕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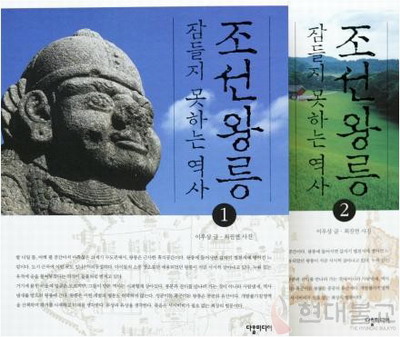
저자 이우상은 우리대학 국문학과 출신으로 9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중편소설로 등단한 소설가다. 그는 장편 『비어있는 날들의 행복』외 활발한 창작활동으로 중진 작가의 반열에 있는가 하면, 2006년에는 캄보디아의 불교 유적지를 순례하여 『앙코르와트의 모든 것』으로 지가를 올렸다.
본『조선왕릉』도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재되기 훨씬 전부터 오랜 벗이자, 사진작가인 최진연과 실제 답사는 물론,『왕조실록』을 낱낱이 확인해 가계도와 그 숱한 적손 서손 및 공주 옹주의 이름까지, 그러니 왕실의 부끄러운 비사마저 알뜰히 밝혔는가 하면, 관련 자료·사진·약도까지 빠뜨리지 않는 섬세함으로 독자를 감격시키기에 최선을 다했다.
그는 말한다. “최상의 법문은 죽음이다. 왕은 권력의 정점이다. 권력의 정점에 앉았던 이들의 죽음은 최상의 법문일까. 500년 조선 왕조의 영욕을 온몸으로 받다가 이승을 하직한 왕들의 무덤, 거기에 그들이 있다”라 하고, “왕은 죽지 않는다. 아니 죽지 못한다. 육신은 소멸되었으나 행적은 불멸이다. 잊혀지길 원해도 잊혀질 수 없는 시퍼런 역사로 살아, 불멸의 이름을 달고 높다란 봉분 아래 누워 있다. 누워있는 그들을 깨워 권좌의 영광과 애환을 들어보자”며 특유의 유머와, 때론 패담 같은 너스레도 마다하지 않다가, 문득 “조선 왕조 518년, 27대 역대 왕과 왕비, 추존 왕과 왕비의 능(陵) 42기와. 왕의 사친, 왕세자와 그 비의 원(園) 13기, 대군·공주(왕의 적녀)·옹주(왕의 서녀)·후궁·귀인 등의 묘(墓) 64기 등 신분에 따라 분류한 능·원·묘를 합쳐 조선 왕조, 왕족의 무덤은 모두 119기가 있다”는 등 미지의 정보로 독자의 무지를 희롱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능의 형식은 분묘 조성 형태에 따라 구분된다며, “단릉·쌍릉·삼연릉·동원이강릉·동원상하봉릉 등이 있다며, 각 능호와 왕을 밝혔다. 이어 합장릉은 왕과 왕비를 하나의 봉분에 합장한 형태로 조선 초『국조오례의』에서 정한 조선 왕실의 기본 능제라 하고, 삼합장릉은 왕·왕비·계비를 함께 합장한 형태로 유릉(순종)이 유일하다”했다. 결국 “능은 단릉이든 합장이든 권력의 성쇠,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며, 태조 이성계는 신덕왕후 강씨를 몹시 사랑해 강비의 능을 도성 안에 만들었지만, 태조가 죽자 태종은 양주 사한리(현 성북구 정릉동)로 이장하고. 후궁으로 강등해 묘로 격하시켰다”며 죽으면 끝인 게 세속의 이치지만, 권력과 연루되면 죽어도 끝이 아닌 역사의 뒤안을 귀띔하기도 한다.
한편, “영조는 조선 역대 왕 중 가장 오래(52년) 왕위에 있었으며, 그는 생전에 현 서오릉에 자신의 수묘(가묘)를 만들었지만, 정조는 영조가 죽자 그 반대쪽 동구릉, 그러니 100년 전 효종의 능이었던 파묘 자리에다 영조를 묻었다.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인 할아버지가 너무나 미웠기 때문이다”며, “죽어서도 편히 눈 감지 못하는 자, 살아있는 자만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자, 그들의 이름이 왕이다”라며 “권좌에 앉았다는 이유로 그들은 언제나 동시대인과 함께 산다” 했지만, 정작 우리는 ‘영 죽은 자들의 무덤으로만 여겨왔다.’
그렇다. 다민족·다문화시대에 남들이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인정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의 차원을 넘어,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자긍심은 물론, 타민족에게도 일깨워 줄 지성인의 자질도 갖춰야겠다. 일독을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