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원을 열어가는 이야기와 담론의 寶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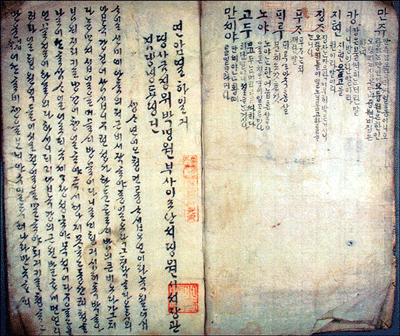
조선시대 해외여행은 사행(使行: 중국과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위한 여행)으로 제한되고 여행자는 연행록 또는 동사록과 같은 여행일기를 남긴다. 그런데 연행록 중 연암 박지원(燕岩 朴趾源: 1737-1805)의 ‘열하일기(熱河日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여타 연행록과는 달리 그 편제나 내용, 문체 등이 매우 이채롭기 때문이다. 한 대목을 보도록 한다.
책문 밖에서 책문 안을 바라보니 민가들인데도 대개는 다섯 들보가 높이 솟아 있는 집들이다. 이엉집이지만 용마루가 높이 솟고 문호가 번듯하며 거리는 곧고 평평하여 길가 양측은 먹줄을 친 듯 곧다. 담장은 모두 벽돌로 쌓았고 거리에는 사람 타는 수레, 짐 실은 마차가 왔다 갔다 한다. 벌여 둔 그릇은 모두 꽃그림 사기그릇으로 일반 풍물이 하나도 시골티가 없다.
전일 벗 홍대용에게서 중국 문물은 규모가 크면서도 수법은 세밀하다고 한 말을 들은 적이 있지만 오늘 보니 책문은 중국의 맨 동쪽 끝 벽지인데도 오히려 이만하거든, 앞으로 구경할 것을 생각하니 문득 기가 꺾여 그만 예서 발길을 돌리고 싶은 생각이 치밀며 온몸에 불을 끼얹은 것 같은 후끈한 느낌이다.
그러나 나는 ‘이것은 질투심이다. 내 본성이 담박해 일찍이 부러움이나 질투·시기가 없었는데, 한 번 국경을 넘어 타국의 경내에 발을 들여 놓았을 뿐인데도, 아직 그 만분의 일도 못 본 내가 벌써 이런 그릇된 생각을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아직 본 것이 적은 탓일 것이다. 소위 시방 세계를 둘러본다는 석가여래의 밝은 눈으로 본다면 세계는 평등이 아님이 없을 것이다. 만사가 평등이면 질투도 없을 것이 아닌가?’라 반성하며, 나는 장복에게 물었다. “장복아, 너는 죽어서 중국에 한번 태어나면 어떨꼬?” “천만에요. 소인은 싫습니다. 중국은 되놈땅이니까요.” 마침 한 장님이 어깨에 비단 주머니를 둘러메고 손으로 월금을 타면서 지나간다. 나는 깨달았다. ‘응! 이것이야말로 정말 평등한 눈이로구나.’
압록강을 건너 청나라 쪽 경계인 책문에 막 들어가며 저자의 눈에 들어오는 풍경을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한 대목이다.
중국의 변방인 책문의 화려함을 보니 질투심이 나 온몸에 불이 난다고 했다. 이는 세상을 널리 보지 못한 탓이라 반성한다. 북경 장유(壯遊)의 의지를 다지는 연암의 마음가짐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열하일기’는 1780년 연암이 사신단을 따라 중국의 북경과 열하를 다녀오면서 보고 들은 것을 적은 일기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다. 철학역사 문학예술 정치경제 천문지리 과학기술 의학 서지학 등에 관한 백과사전적 기록이면서 비평서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이 치밀한 묘사와 다양한 수사 장치를 동원한 문체, 그리고 역설과 풍자가 번득이는 문장으로 형상화 되어 있어, 그 자체로서 가관이다.
하지만 ‘열하일기’의 패사소품적(稗史小品的) 성향은 정조대왕의 노여움을 샀고, 이른바 문체반정(文體反正)을 야기하였다.
‘열하일기’를 보면 현상의 이면에 깃든 진실과 진정을 찾아내려는 연암의 예민한 눈과 넉넉한 지성을 만나게 된다. 곧 18세기 실학시대 한 지성의 관념화한 주자학적 지배질서에 대한 비판과 풍자, 그리고 그러한 지배질서에 허덕이는 민중과 나라를 구제하고자 하는 고뇌와 충정, 나아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느낄 수 있다.
‘열하일기’엔 지역과 나라·상하층을 막론한 수많은 인물이 등장한다. 이들을 대하는 연암에게 상하귀천의 관념이나 지역적 편견이 무디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이미 근대인이요 자유인이었던 것이다.
여행은 먼저 친숙하고 반복되는 것들로부터의 떠남이며 버림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요구한다. 한편 여행은 머묾이 아닌 이동이기 때문에 여행자는 나그네로서 공간적 심리적 경계선에 서게 되고, 따라서 자기 위치를 성찰할 수 있는 객관자의 자리에 설 수 있다.
‘열하일기’는 이러한 여행의 정신을 한껏 살린 역작이라 할 것이다. 요컨대 ‘열하일기’는 18세기 박지원이란 한 조선인의 자기 성찰이면서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이 벌여놓은 세계에 대한 통찰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그것은 흥미위주의 패관기서적(稗官奇書的) 성격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김상일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