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신문 정동훈 편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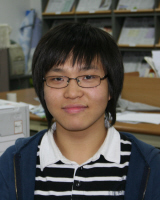
장 콕토는 소설을 통해 아이들만의 순수함과 더불어 잔인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처음 소설 속 앙팡테리블은 무서운 아이들이란 뜻이었다. 최근에는 어린 나이에도 뛰어난 기량을 보이는 스포츠 스타를 일컫는 말로 쓰인다. 치고 올라오는 후배가 선배에게 무섭게 비쳐져 이런 별명이 붙지 않았을까.
▲개교기념일인 8일이었다. 우리대학과 중앙대의 MBC배 전국대학농구대회 결승전이 열렸다. 4학년 주전 대부분이 프로팀에 진출하며 전력이 약화됐다는 평을 듣던 우리대학이 결승전까지 진출한 것이다. 놀라운 것은 주전 엔트리였다. 1학년 3명에, 4학년 1명, 3학년 1명. 평균연령이 스물 한 살이다.
이날 우리대학은 패했다. 그러나 1학년 김종범, 김윤태 등은 앙팡테리블로 불리며 패배 속에서도 희망을 보여줬다. 상대 가드를 앞에 두고 3점 라인 몇 발자국 뒤에서 3점 슛을 성공시키는가하면, 신장의 열세 속에서도 놀라운 돌파를 보여줬다.
▲코트는 뜨거웠지만 관중석은 냉혹했다. 지방에서 열린 대회라는 점이 이유기도 했지만 관중이 없는 대학스포츠의 단면을 보여줬다. 수많은 스포츠 스타를 배출했던 한 사립대학은 최근 축구, 야구, 농구 팀을 사실상 해체했다. 내년부터 신입생을 뽑지 않기로 한 것이다. 프로스포츠에 예속된 대학스포츠의 미래가 어둡다는 판단에 따른 선택이었다.
과거 대학스포츠는 대학에서 화합의 장이자, 축제였다. 1980년대 우리대학 야구부가 그랬다. 오죽하면 동대문 운동장을 ‘동대 운동장’이라고 불렸을까. 우승을 하고나면 동대문운동장에서 우리대학까지 오는 도로는 풍물패와 우리대학 학생으로 가득 찼다고 한다. 80년대 우리대학은 야구로 하나 될 수 있었다.
▲우리대학 농구부는 과연 앙팡테리블이었다. 비록 결승전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지만 주축선수들이 신입생이란 점을 감안할 때 준우승은 얼마나 값진 결과인가. 박수쳐주는 이가 많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래서 더욱 아쉽다. 스포츠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도 한다.
최근 들어 학내 갈등이 첨예하고 서로간의 공통분모를 찾기 힘들다는 느낌을 받는다. 대학스포츠가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나친 억지일까. 학생, 교수, 직원이 공동응원단을 구성할 수도 있다고 본다. 지방 경기라면 WBC처럼 중강당에서 TV를 보며 응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동국대학교라는 이름아래 소통하고 뭉치는 일은 함께 즐기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때 가능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