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하한기 녹이며 내딛은 발길…곰과 조우할 땐 ‘아찔’
<동대신문=특집>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을 것만 같은 나라, 4계절 내내 하얗게 눈이 부신 나라, 그곳이 바로 내 상상속의 알래스카였다. 털모자와 두터운 장갑, 새어나오는 하얀 입김, 개들이 썰매를 끌며 뛰어 다니고 있을 것만 같은 나라, 그 곳이 바로 내가 상상하던 알래스카였다. 하지만 고된 비행 끝에 찾아온 알래스카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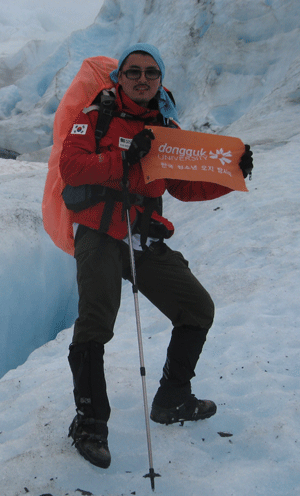
자동차를 타고 한참을 달렸다. 저 멀리 빙하가 보였다. 나는 그때까지 빙하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곧 내가 생각하던 빙하와 실제 빙하가 엄연히 다르단 사실을 확인했다.
랭겔 세인트 국립공원에서 캠프지를 정한 후 우리는 루트 빙하지대 트레킹(목적지가 없는 도보여행)을 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빙하지대 트레킹을 위한 장비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캠프지를 나섰다. 눈앞에 빙하가 펼쳐졌다. 빙하지대에 올라서서 모두 슈패츠와 아이젠을 착용했다. 그리고 아이젠을 이용한 도보법을 동행한 대장님과 지도위원님에게 배웠다. 생각보다 어려웠다. 방향전환을 할 때나 넘어졌을 때, 그리고 발 전면으로 딛어야 하는 도보법은 생각보다 체력을 많이 소모하게 했다.
빙하 사이사이로는 크레바스도 보였다. 눈이 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모두 육안으로 식별 가능했다. 사이사이에 계곡 같은 것도 보이며 아래에는 빙하 물이 흐르고 있었다. 빙하 겉면은 모래 같은 것이 쌓여 지저분해 보였지만 안쪽은 정말 투명한 보석 같았다. 우린 우모복에 자켓까지 입고 있었지만 알래스카 빙하의 한기는 우리를 점점 얼게 만들었다. 그러나 추위 속에서도 내딛었던 한 걸음, 한 걸음은 자신감을 갖게 해 주는 무기이기도 하다.
곰으로 인한 도노호 등정 포기
알래스카 하면 떠오르는 동물은 곰이다. 오지탐사를 하면서 우리는 곰과 자주 마주쳤다. 곰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우린 곰 스프레이를 사용했다. 곰 스프레이는 온갖 맵고 짠 최악의 냄새를 농축시켜 만든 스프레이로 곰을 죽이거나 제압할 순 없지만 곰 퇴치 시 요긴하게 사용된다. 데날리 국립공원에서 있었던 일이다. 우리 팀원 두 명이 다른 대원들과 함께 새로운 트레일(trail)을 개척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가까이서 곰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그들은 그 비싼 곰 스프레이를 개봉 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곰 스프레이를 사용할 기회는 오지 않았지만 그만큼 숨 가쁜 순간이었다고 전해진다. 곰은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 있었다. 그리고 랭겔 세인트 국립공원에서 우리는 원래 가기로 했던 캠프지가 며칠 전 곰의 습격을 받아 폐쇄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곰들이 사람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앞에서 손짓하고 있는 도노호 봉우리 등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새로 자리 잡은 베이스캠프에서 도노호 봉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아쉬움이 남았다. 하지만 곰을 탓할 순 없었다. 우리가 그들의 영역을 먼저 침범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영역에서 살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 선을 조금씩 넘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곰뿐만이 아닌 자연이라는 주인공의 위치를 우리가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탐사 내내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점보마인 원정

우리가 올랐던 점보 마인은 원래 계획에 있었던 도노호 봉우리의 차선책이었다. 도노호 봉우리를 뒤로 한 채 우리는 옆에 있는 점보 마인을 오르게 되었다. 도노호 봉우리에게 마음을 뺏겨서 그런지 점보마인은 실망감이 앞섰다. 우리나라와 다를 것 없는 완만한 산길, 낮은 높이, 이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위로 갈수록 난 알래스카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저 멀리 보이는 풍경과 드높은 하늘, 그리고 만년설의 아름다움까지. 우리는 구름 위를 거닐고 있었던 것이었다. 저 아래에서 바라만 보았을 그곳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산하는 도중 조그마한 사고가 났다. 재화 형이 넘어져서 돌에 무릎을 찍힌 것이었다. 하지만 재화 형은 웃으면서 괜찮다고만 했다. 산을 내려와서 치료를 하고 며칠간 휴식을 취했다.
마가렛 원정
얼마 후 데날리 국립공원에 새로운 캠프를 마련한 후 우리는 마가렛산을 올랐다. 우리는 재화형에게 쉬라고 했지만 형은 쉬는 게 더 힘들다며 같이 오르자고 했다. 마가렛 산은 지금까지 우리가 오르던 산과는 조금 달랐다. 고산지대에서 나타나는 키가 작은 나무들과 풀들 그리고 툰드라 지형도 있었다. 올라가는 내내 야생동물과 야생풀들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저 멀리에서는 멋진 풍경도 펼쳐졌다. 하지만 계속 올라갈수록 날씨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재화형의 상태도 악화되어갔다. 마침내 마가렛 산 정상에 도착하였다. 그 순간 엄청난 바람이 불면서 진눈깨비까지 휘날렸다.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대장님은 빠른 하산을 결정하셨다. 우리는 다시 채비를 단단히 하고 하산을 준비했다. 재화형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할 수 없이 재화 형을 재훈이와 창섭이가 교대로 업으며 천천히 내려왔다. 아무도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다. 다들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 모두는 안전하게 산을 내려왔고 재화형의 상태도 호전되었다. 이제 누군가가 나에게 산을 왜 오르냐고 하면 그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오른다고 말하고 싶다. 그게 누군가 말하는‘등인주의’가 아닐까.
알래스카의 마지막 밤
어느 덧 알래스카의 마지막 밤이 찾아왔다. 내일 새벽이면 우리는 이 아름다운 알래스카를 떠나야 한다. 알래스카의 밤은 아주 늦게 찾아온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밤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 백야현상 때문이다. 저녁 8시부터 해가 조금씩 지기 시작하여 자정까지는 우리나라 초저녁 같은 분위기를 낸다. 그리고 자정이 넘어서야 해가 완전히 저 우리가 말하는 밤이 되는 것이다. 그날 밤은 모든 여행이 그렇듯 아쉬움으로 지샜다. 알래스카 밤하늘을 별빛과 불꽃으로 채우며 우리는 알래스카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점점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아쉬워하며 짐을 챙겼다. 그리고 우리는 알래스카를 남겨두고 떠나게 되었다. 내 생애 가장 추운 여름을 보낸 알래스카, 그러나 가장 따뜻한 추억으로도 남을 듯하다.
양희종(사과대 경제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