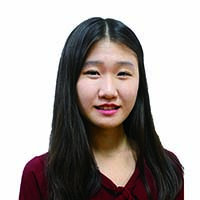
음식 배달 전화를 시킬 때 대본을 써놓고 전화를 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나다.
어릴 때부터 사람을 대하는 것이 능숙하지 않아 낯선 이와 통화를 하면 말을 더듬었고 많은 이들 앞에 서면 벌벌 떨기 일쑤였다.
이렇게 소심한 내가 갓 수습기자가 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원고를 부탁해야하는 시론 청탁을 맡았다.
마감은 다가오는데 누구에게 청탁을 할지 몰라 전화번호부를 뒤져 우리대학 교수님들을 찾아냈다. 전화로 연락을 드리니 다들 여러 이유로 글을 써주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다. 나는 우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 길로 교수님을 찾아갔다.
내가 찾아뵌 교수님은 대학원 학장도 맡고 계신 분이었다. 학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전화를 하고 왔냐며 직원 분께서 나를 막으셨다. 항상 내 옆을 지키던 대본도 없이 예고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나는 전화를 하고 온 건 맞으니 고개를 끄덕였다. 연락을 못 받았다는 학장님의 말씀에 직원 분이 의심의 눈초리로 나를 흘겨보셨다. 다행히도 일단 들여보내라는 학장님의 말씀에 나는 무사히 학장실에 들어가 원고를 부탁드릴 수 있었다.
나는 여전히 말을 더듬고 사람을 대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소설 데미안에서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야한다’는 글귀가 있다.
새는 자신의 세계였던 알을 깨고 나와야만 비로소 태어날 수 있다. 나는 계속해서 알을 향해 조심스런 손길을 뻗는다.
부족하지만 ‘수습’ 이라는 알을 깨고 기자라는 이름을 향해 나아가려 한다. 이제 시작이다.
권나형 기자
lily9709@dgu.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