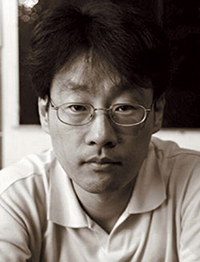
당시 파리 문단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던 것은 에밀 아자르라는 신인작가였다. ‘그로 칼랭’이나 ‘자기 앞의 생’ 같은 소설이 보여주는 신선한 충격에 파리는 환호했다. 특히 아랍계 소년 모모와 유대인 유모 로자 아줌마의 우정을 그린 ‘자기 앞의 생’은 공쿠르 상을 수상하면서 베스트셀러가 된다. 그리고 1980년, 늙은 로맹 가리는 권총자살을 결행한다. 유서에서 로맹 가리는 자신이 바로 ‘자기 앞의 생’을 쓴 ‘신인’ 작가 에밀 아자르임을 고백한다.
이것이 소위 아자르-가리 사건의 전말이다. 사람들은 흔히 세간의 무관심에 지친 노대가가 신인 코스프레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로맹 가리가 그냥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던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과거를 지우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미 맥락들을 지우고, 텅 빈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고 말이다. 문학이란 어쩌면 그런 욕망 외에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자기 앞의 생’(La vie devant soi)이라는 매력적인 제목은 일종의 ‘의도된 오역’에 가깝다. 프랑스어로는 ‘여생’(餘生)이라는 의미로 시간적 뉘앙스가 강한데, ‘자기 앞의 생’이라는 직역은 이 소설에 실존적인 향기를 부여해준다. ‘자기 앞의 생’은 아랍 소년과 유대인 유모라는 이질적 존재들, 중심에서 배제된 존재들을 한 자리에 모아 그들의 시선으로 삶을 직시하게 만든다. ‘여생’은 그렇게 해서 ‘자기 앞의 생’이 된다. 독자들뿐 아니라 로맹 가리 자신에게도 이 소설은 ‘여생’을 ‘자기 앞의 생’으로 바꾸어내는 마술적인 활력을 선사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에밀 아자르’의 신선함을 얻기 위해서 모두가 가명을 쓸 필요는 없다. 마침 우리의 대학 교정에는 새 학기가 시작된다. 우리는 그냥 새로운 맥락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새로운 시간, 새로운 학기, 새로운 교실,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말이다. 나는 그런 것이 우리 삶에 깃든 작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에밀 아자르의 삶과 죽음’이라는 마지막 글에서 로맹 가리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청춘, 초창기, 첫 소설에 대한 향수, 다시 시작하고 싶은 욕구… 나는 그런 것에 시달렸다. 새로 시작하는 것, 다시 사는 것, 다른 존재로 사는 것이 내 존재에 큰 유혹으로 다가왔다.”
새로운 학기는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다. 새로 시작하는 것, 다시 사는 것, 다른 존재로 사는 것…… 자기 앞의 생을 조금쯤은 바꾸어보는 것.
이장욱
국어국문ㆍ문예창작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