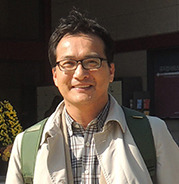
이러한 장소는 개인이 아닌 집단이 기억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주제로 한 전시에는 항상 집단의 기억이 모이고 그 장소를 추억하는 관람객들이 많습니다. 사실 역사란 것도 따지고 보면 도시와 국가, 민족, 더 나아가 인류의 집단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미가 큰 것들이 살아남아 세계사, 국가사, 도시사 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1989년도에 학부에 입학해서 1999년까지 11년 동안 다녀서 공식적으로 학교를 떠난지는 15년 정도 됩니다. 자주 들르지는 못하지만, 가끔 대학 교정에 가면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대학 내의 많은 장소들이 변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서 저와 비슷한 세대인 우리가 기억하는 작은 장소들이 사라져서 많이 아쉽습니다. 졸업이나 기념사진의 배경이 되던 코끼리탑 위에는 코끼리 대신 새로운 UI(University Identity)가 놓여져 있고, 생일 맞은 친구를 장난삼아 빠트리곤 했던 분수대가 메워져 코끼리 가족상이 들어섰습니다. 여자친구와의 추억이 있던 학림관 뒤 정원에는 근사한 목조 데크가 들어섰습니다. 오직 우리 대학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팔정도의 석가입상만이 변함없이 굳건한 모습으로 학교의 중심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변화와 발전은 이 시대의 주요 화두인 듯합니다. 이 단어들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지금의 현상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청춘의 대부분을 보낸 모교의 낯익은 공간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가는 현상은 왠지 모를 씁쓸함을 남깁니다.
물론 캠퍼스 내 시설들이 비록 의미가 작을 수도 있지만, 대학차원에서라면 많은 동문과 재학생들이 기억하고 추억할만한 대학의 공간을 남기는 작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바뀐 캠퍼스에서 우리 후배들이 기억하는 대학의 추억은 이전 동문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후에라도 학교의 경관이 대규모로 바뀌는 사업이 추진된다면, 대학의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남겨둬야 하는 우리 대학의 장소적 자산은 무엇인지에 대해 숙고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합니다. 그것이 우리대학이 자랑하는 역사를 후대에 전하고, 대학의 구성원들이 기억을 함께 공유하도록 해주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양균
사학과 95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