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도 불어온 웰빙바람 능동적으로 과하지 않은 식생활 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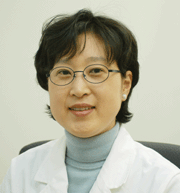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은 대학가와 떨어진 주택가에 있어 요즘 대학가가 어떤지 궁금한데 가끔 학교를 들릴 일이 있으면 예전에 보던 분식점, 자장면 집은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이다. 그래도 안을 들여다보면 ‘웰빙’이 붙어있는 메뉴를 심심찮게 발견하니 예전과 많이 바뀐 것 같다. 또한 대학교 근처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음식업체인 죽 전문점이라든지 생과일 주스점들도 이젠 볼 수 있다. 대학가 안에서도 김밥보다는 양배추 말이 밥이 인기가 좋다고 하니 칼로리, 지방에 신경을 많이 쓰는 영리한 학생들이 많아진 것 같다.
필자의 전공이 당뇨병, 대사 증후군 등 현대병을 전공으로 하는 내분비대사내과인지라 진료실에서 접하는 환자들을 보다보면 대개 정상보다 약간 빗나가 있는 사람을 대하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뭐가 정상인지 혼란이 오는 경우도 있다.
건강한 식생활이란 과하지 않는 식생활이 아닐까 한다. 자기 표준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식생활 말이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이를 위해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단순한 생활 규칙만 정해놓아도 될 듯하다. 잔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앉아서 적당량을 식사하기, 이는 대학생이 아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하는 소리 같지만 폭식을 하지 않는 지름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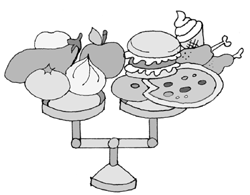
그러나 우리나라 문화는 본인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남의 눈치를 보는 문화가 상당히 있다. 내가 이대로 하고 싶은데 남들이 권하는 술에 할 수 없이 먹어야 하는 현실이다. 내게 취향이 맞지 않으면 정중히 거절할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다. 미국 대학식당에 가면 부러운 것이 채식 주의자를 배려한 코너가 따로 있어서 본인의 취향에 맞게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는 반대로 특히 여학생에게서 볼 수 있는 현상인데 정상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과체중이라고 착각해서 ‘살아, 살아, 내 살아^^’하는 학생들이 꽤 있다는 사실이다. 건강해 보이는데 비만이라고 불만이다. 의사 입장에서는 저체중도 비만만큼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에 무조건적인 다이어트는 경고를 하게 된다.
대학 생활이 시험, 봉사, 학문 연구로 바쁘겠지만 몸짱 신드롬처럼 몸에 신경 쓰는 학생이 많아지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러한 웰빙 붐으로 대학생이 능동적으로 삶의 질을 추구하게 되었음 하는 바람이 있다.

